1914년 7월 28일에 시작되어서 1918년 11월 11일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은 당대에는 그레이트 워(The Great War)라고 불렸다. 그러나 천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를 포함해서 40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전쟁 이후 또다시 세게대전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제1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피비린내가 나는 한성에서는 그 누구도 두 번째 왕자의 난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잔혹한 권력은 힘을 합쳤던 동복 형제들끼리 다시 싸움을 벌이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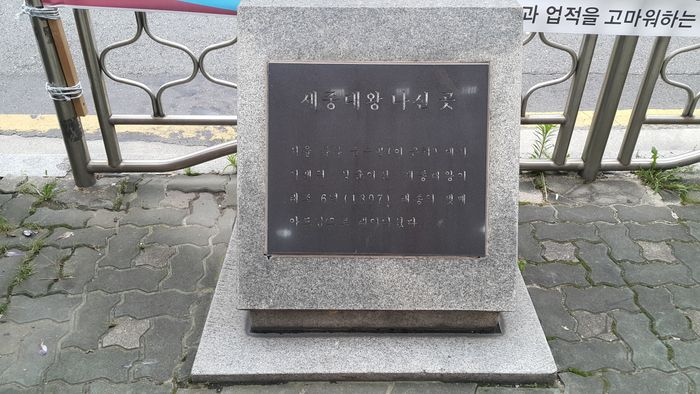 세종대왕 탄생지 표지석 (직접 촬영)
세종대왕 탄생지 표지석 (직접 촬영)
시작 혹은 발화점은 박포라는 이성계의 측근이었다. 조선이 건국하면서 대장군에 임명되었고,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졌을 때는 이방원에게 가담해서 맹활약을 하면서 지중추원사에 임명된다. 종2품의 고위관직이었지만 박포는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럴 만도 한 게 목숨 걸고 칼을 휘두른 자신은 2등 공신에 책봉되는데 그쳤고, 하는 게 없었던 조준과 이무 같은 인물들이 오히려 1등 공신에 올랐던 것이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야 할 불만을 밖으로 터트린 박포는 무인정사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서기 1398년 9월 12일, 고향으로 추정되는 죽주로 유배되었다.
박포를 죽주에 귀양보내었다. 박포가 사직을 안정시킨 후에 스스로 공로가 여러 신하들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불평하면서, 이에 정탁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몇 년 후에 돌아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과격한 성격의 그는 또 다른 불만 세력을 찾아낸다. 바로 이방원의 형인 이방간이었다. 이방간 역시 동생인 이방원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을 불만스럽게 바라봤다. 결국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이방원을 몰아내기로 한다.
서기 1400년 1월 28일, 임금은 태종에서 정종으로 바뀌었지만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왕자들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그나마 이복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제2차 왕자의 난은 동복형제들끼리 벌어진 더 심한 비극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말았다.
지지세력을 모으려다 여기저기서 정보가 새어 나갔다. 그리고 당일 날 아침, 이방간의 아들 중에 가장 용맹하다고 알려진 이맹종이 대담하게도 이방원의 집을 찾아와서 분위기를 살핀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도 사냥을 나간다고 둘러대고는 돌아간다. 이방원 역시 형의 집을 염탐하면서 가병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굳이 대응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청했다. 이방간은 당연히 거절했다. 이방원은 아내와 측근들의 간곡한 애원에 못 이겨 갑옷을 입고 말에 탔다. 그 사이, 이방간은 아버지이자 태상왕이 된 이성계와 형이자 임금인 이방과에게 각각 사람을 보내 자신이 동생을 칠 것이라고 통보한다. 하지만 이방과는 그에게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정신이냐는 답변을 보냈다. 아들과 측근들의 죽음으로 인해 누구보다 이성계를 증오하던 이성계 역시 이방간의 편을 들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싸움을 말리도록 했다.
이성계가 보낸 사람이 가병들을 이끌고 진격하던 이방간과 마주친 장소는 다름이 아닌 선죽교였다. 제1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임금이 된 이방과는 제사를 핑계로 개경으로 돌아가 버렸다. 새로운 도읍인 한성이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대신들과 백성들도 하나둘씩 개경으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제2차 왕자의 난은 조선의 도읍인 한성이 아니라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경에서 벌어졌다. 어쨌든 이방간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동생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양측의 충돌 역시 선죽교 근처에서 벌어졌다. 만약 정몽주의 영혼이 남아있었다면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양측이 서로 어지럽게 활을 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전투는 이방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애초부터 많은 세력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방간의 가병들이 이기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정작 이방간을 부추긴 박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집에서 자고 있었다.
결국 패배한 이방간은 공양왕이 조상 제사를 위해 만든 적경원 터가 있던 곳까지 달아났다가 결국 말에서 누워 바닥에 뻗었다. 패배의 충격과 지친 몸으로 인해 자포자기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인 이맹종은 따로 도망치다가 궁궐로 가서 큰아버지인 정종이 있는 대궐로 가서 목숨을 부지했다. 하지만 이방원이 따로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둘 다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만약 성공했다면 갑진년이라서 갑진정사쯤으로 불렸겠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방간의 난이나 박포의 난이 되었고, 오늘날 교과서에는 제2차 왕자의 난으로 남게 되었다.
이방원의 추궁에 박포의 부추김이 있었다는 자백을 한 이방간은 아들 이맹종과 함께 황해도 토산으로 추방당했다. 그리고 집에서 자고 있던 박포는 체포되어서 형제간의 반목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함경북도 함흥 근처의 함주로 유배되었다. 이방원이 공신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박포를 처형하라는 상소가 빗발치듯 이어지자 결국 관리를 보내서 사형에 처한다.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모 드라마에서는 망나니가 얼굴에 술을 여러 번 뿜어대는 장면 때문에 일종의 밈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아버지와 함께 유배를 갔던 이맹종은 뒤늦게 조카인 세종대왕에 의해 처벌당한다. 세종대왕이 뒤끝있게 사촌 형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혹시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아침, 집에 찾아온 사촌 형을 보고 가졌던 두려움이 원인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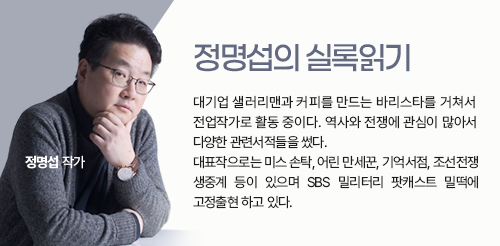 ⓒ
ⓒ
정명섭 작가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주요뉴스
실시간 주요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