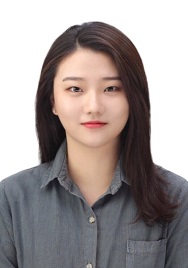기아, 올해 유럽 전기차 시장 '총력'
中 BYD, 美 포기하고 유럽 집중 전략
BYD 프리미엄 브랜드 '덴자'도 상륙
전기차 점유율 경쟁 치열해질 듯
 기아 EV4 ⓒ기아
기아 EV4 ⓒ기아
올해 유럽에서 전기차 보급 적기를 맞은 기아가 강력한 적수를 맞닥뜨렸다. 유럽 시장 내에서 한 수 아래였던 BYD가 잇단 공장 투자와 신모델 투입으로 팔을 걷어붙이면서다.
현재 BYD의 경우 27%의 높은 유럽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이지만, 올 연말부터 현지 생산을 시작하면 관세 부담을 상당부분 덜게 된다. EV3, EV4 등 보급형 전기차를 내세우려던 기아에게는 가격 경쟁력면에서 최대 적수가 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는 유럽 첫 공장인 헝가리 공장의 생산을 올 연말부터 시작한다.내년에는 튀르키예 공장이 추가로 완공되며, 세번 째 유럽 공장으로는 독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가 부과한 관세 조치를 ‘현지 생산‘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난다. EU는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 관련 불공정 경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본 관세 10% 외 BYD에 17%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정한 바 있다.
올해 말부터 관세 부담이 서서히 줄어드는 만큼, 연초부터 드러낸 유럽 시장에 대한 의지도 공격적이다. 저가형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그간 ‘전기차’로만 승부해왔던 주요 시장들과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출시하기로 하면서다.
소형차 수요가 높은 시장 특성에 맞춰 지난해 출시한 아토2에 이어 씨걸의 소형 버전 모델을 올해 4월에 내놓을 예정이며, 프리미엄 브랜드 ‘덴자’의 유럽 진출도 공식화했다. BYD는 향후 10년 내 유럽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유럽 공략을 주요 과제로 뒀던 기아 역시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됐다. 기아는 중장기 전기차 전략 발표회인 ’EV데이‘를 올 초 스페인에서 개최하고, 유럽 맞춤형 모델 3종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기아의 전략이 ‘저가형 모델 보급 확대‘인 만큼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한 BYD와 직접적 경쟁이 불가피하다.기아는 최근 2~3년 간 유럽에서 EV6, EV9을 먼저 출시해 기술력을 알렸고, 지난해 EV3 출시에 이어 올해 EV4로 본격적인 수요 확대를 구상 중이었다.
BYD의 경우 기아의 두 보급형 모델보다 1000만원 이상 저렴한 아토2를 올 초 프랑스에서 출시한 상황이다. 오는 4월 출시할 씨걸 소형 모델 역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가 내놓을 3만 유로대 유럽 전략형 모델 EV2의 출시 시기는 내년으로, 올해 아토2를 막을 수 있는 모델은 사실상 없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BYD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 ‘극복이 어렵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EV데이에서 “약 20%인 중국 브랜드와의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조금씩 줄이려고 하고 있다.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 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럽 소비자 특성상 브랜드 이미지 보다 '가격 경쟁력'을 중시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상품성과 기술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유럽 소비자들 역시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최대 요인으로 가격을 꼽고 있다.
실제 가격을 앞세운 중국 브랜드들의 유럽 내 판매 확대 조짐도 연초부터 본격화됐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2월 유럽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한 3만8902대를 기록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작년 대비 2.5%에서 4.1%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기아에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졌단 점은 위기감을 키우는 요소다. 전기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수익 약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BYD의 경우 미중갈등으로 인한 관세 장벽 탓에 애초부터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이번 트럼프 관세로 인해 받을 타격 역시 사실상 거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최근 주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장임은 분명하다. 전기차 시장이 활발하게 열렸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앞서있어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특히 유럽 내 르노, 폭스바겐 등 막강한 대중브랜드들이 포진한 상황인 만큼 점유율을 단숨에 높이기는 어렵다. BYD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빠르게 침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